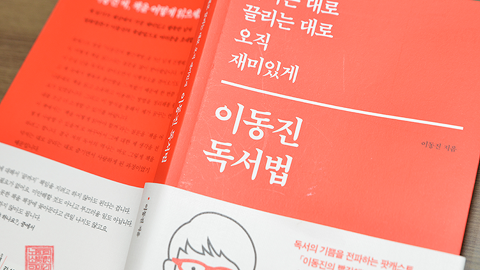마티네의 끝에서, 주말에 읽기 좋은 장편 소설
- 문화/독서와 기록
- 2017. 8. 5. 07:30
아름다운 음악과 짧지만 가장 깊었던 사랑을 그린 장편 소설
지금까지 나는 제법 많은 책을 읽었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막상 그 모든 책을 다 기억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살짝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분명히 내 손때를 탄 책들은 열의 아홉은 최소 한 장면이라도 기억에 남아 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 속에서 먼지처럼 사라진 책들도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영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감동하면서 읽은 이야기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나지 않기 마련이고, 아무리 울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일도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이다. 사람은 그렇게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보면서도 미래에서 과거를 본다.
오늘 소개하고 싶은 소설 <마티네의 끝에서>는 마치 오늘을 통해 미래를 보는 것 같지만, 미래를 통해 과거를 보는 듯한 소설이었다. 소설의 제목에 사용된 '마티네'라는 단어의 뜻이 궁금해서 사전을 검색해보았는데, '마티네'는 프랑스어로 '아침나절, 낮 공연'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였다.
소설 속 이야기를 빌려 <마티네의 끝에서>라는 제목을 해설하자면, '공연 끝에서 만나는 인연'이 바로 이 소설의 실질적인 제목이지 않을까 싶다. 소설 속 남자 주인공은 '천재'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 기타 연주자이고, 여자 주인공은 어느 영화감독의 딸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겨우 반나절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을 뿐인데, 그 이야기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인연의 싹이 트게 된다. 우연히 만나서 짧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인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긴 여운을 남기면서 작은 이별을 고한다. 작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다.
전혀 현실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대로 아침까지 함께 보내는 선택도 있었던 게 아닐까, 하고 나중에야 두 사람은 각자 생각했다. 왜냐하면 훗날 그들의 관계 속에서 이 기나긴 밤의 만남은 특별한 기억으로 수없이 회상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아쉬운 듯 나누었던 눈빛이 특히 '섬세하고도 감지하기 쉬운' 기억으로 남았다. 그것은 끊임없이 과거의 하류로 향하는 빠른 시간의 물결 한복판에서 조용히 고독한 빛을 내뿜었다. 그 너머에는 바다처럼 펼쳐진 망각! 그 바로 앞에서 미래의 두 사람은 상처를 입을 때마다 거듭거듭 그날 밤의 어둠에 둘러싸여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다. (본문 39)
첫 장의 마지막 장면을 읽은 이후 나는 조금 더 집중해서 소설을 읽었다. 소설의 방대한 이야기에 현기증을 느끼기도 했지만, 작가가 음악을 글로 표현한 장면에서 잠시 눈을 멈춰 섬세한 표현에 감탄하기도 했다. 그중에서 마키노가 내면의 목소리로 표현한 현대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 부분을 짧게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현대인은 한없는 시끄러움을 견뎌낸다. 소리뿐만 아니다. 영상도 냄새도 맛도. 어쩌면 온기 같은 것조차도. ......모든 것이 앞다무터 오감에 쏟아져 들어와 그 존재를 한껏 소리쳐 주장한다. ……이 사회는 그래도 성에 차지 않아 개인의 시간 감각을 파열시켜서라도 다시금 좀 더 처넣으려 든다. 참을 수가 없다. ……인간의 피로. 이것은 역사적인,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가 아닐까. 인류는 앞으로 영원히 지속적으로 피로에 지친 존재가 된다. 피로가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특징이 되려는가. 모두가 기계나 컴퓨터의 박자에 휘말려 오감을 주물러대는 소란에 시달리고 하루하루를 헉헉거리며 살아간다. 애처로울 만큼 필사적으로. 죽음에 의해서가 아니고서는 찾아올 일이 없는 완전한 정적.'
이 부분은 마키노가 무대 위에서 마주하는 정적을 표현한 장면이다. 이 장면을 통해서 마키노라는 인물이 무대를 대하는 자세와 함께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짧게 유추할 수 있었다. 소설 <마티네의 끝에서>는 한 인물의 시점에서 끝까지 이야기를 전개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이고 시점을 바꾼다.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이 주인공인 요코와 마키노의 시점을 번갈아가면서 서로를 생각하는 모습이다. 두 사람은 함께 하는 시간을 갖지 못해 아쉬워하면서도 이미 약혼자가 있는 요코는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는 내적 갈등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요코가 느낀 감정은 너무나 확실한 감정이었다.
소설 <마티네의 끝에서>는 책을 읽는 데에는 꽤 인내력이 필요하다. 이야기가 재미없다는 게 아니다. 등장인물의 시점에서 깊이 이야기를 끌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나처럼 단편 소설을 위주로 읽은 사람은 이 소설을 읽는 동안 조금 더 빨리 이야기를 전개했으면 하는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런 피로도 소설 속 두 주인공이 품은 감정을 읽어나가면서 점점 견딜 수 있게 된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은 겪을 '확실히 이 사람이다.'라는 감정의 사랑이지만, 평범하다고 말할 수 없는 두 사람의 인연이 향하는 갈림길은 독자로서 안타까운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마티네의 끝에서>는 마지막에 이를수록 더욱 소설을 손에서 쉽게 떼어놓지 못하게 했다. 새로운 스마트폰 기종이 몇 번이나 나올 시간을 흘러, 마지막의 마지막에 두 사람이 마키노의 뉴욕 공연에서 만나는 모습은 참 멋진 엔딩이었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의 감정이 진하게 마음에 벤 기분이다.
이 소설을 읽는 데에 무려 3일의 시간이 걸리고 말았다. 3일이라고 해도 하루하루 온종일 책을 읽었던 건 아니다. 어머니 일을 돕거나 해야 할 일을 하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책을 읽었다. 그리고 3일째에 해당하는 금요일 밤에 시간을 내어 드디어 <마티네의 끝에서>의 끝을 읽을 수 있었다.
처음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는 다소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이야기 중반부터는 눈을 반짝이며 읽기도 했다. 책을 다 읽은 지금은 <마티네의 끝에서>에서 사용된 표현의 기술을 갖고 싶은 것도 아니고, 소설의 두 주인공이 느낀 '인생에 단 한 번 찾아올 것 같은 확실한 감정'을 느껴보고 싶은 것도 아니다.
그저 나도 잘 알 수 없는 적막함 혹은 공허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감정만이 남았다. 다수의 사람이 휴가처를 맞아 왁자지껄 떠들거나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소음 속에 있을 때, 나는 금요일 밤에 이렇게 홀로 선풍기가 위태롭게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고 글을 쓸 뿐이었으니까.
어쩌면 이 감정 자체가 소설 <마티네의 끝에서>이 가져다준 여운일지도 모른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휴일에 잠시 세상과 문을 닫고, 소설 한 권을 읽고 싶은 사람에게 <마티네의 끝에서>을 추천하고 싶다. 이렇게 장편 소설로 그려진 사랑 이야기는 당신의 남은 휴일을 통째로 뺏을지도 모른다.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