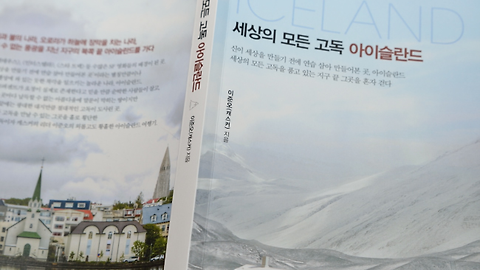다정한 편견이 있으면 글은 꿈틀거린다
- 문화/독서와 기록
- 2015. 7. 11. 07:30
작가 손홍규의 산문집, '다정한 편견'
다음에서 새롭게 선보인 브런치를 이용하면서 나는 매일 문득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글로 옮기고 있다. 비록 내가 적는 글이 진짜 작가의 글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거나 글을 읽는 짧은 시간 동안 여운을 느끼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적고 있다. (→노지 브런치 바로가기)
나는 한 사람의 말하기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고, 한 사람의 글쓰기를 보면 그 사람의 깊이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자신의 머리에 있는 언어로 말하고, 자신의 가슴에 있는 언어로 글을 쓰는 일은 그렇게 나도 모르게 혹은 일부러 자신의 내면을 겉으로 드러내는 일이다.
블로그를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상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 가끔 블로그에 적는 글을 읽어보시는 어머니가 '우리 집 이야기 좀 그만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나는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이야기를 책을 읽고 쓰는 감상 후기와 사회. 정치 그리고 사는 이야기를 하는 데에 인용했다.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편견이다. 개인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글을 작성하고, 사회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행동의 연장선이기 때문이다. 그런 편견이 있기에 내가 쓰는 글은 언제나 '내 글'이 되고, 언제나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는 글'이 된다. 그렇게 글을 쓰고 있다.

알라딘 서평단 활동을 통해 만난 <다정한 편견>이라는 산문집은 작가 손홍규의 사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처음 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읽은 이사카 코타로의 <그것도 괜찮겠네> 산문집을 떠올릴 수 있었는데, 역시 글을 쓰는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는 법인가 싶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에세이는 그 사람이 당시 어떤 상황에 관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엿볼 수 있는 솔직함이 묻어 나는 글이다. 특히 작가는 우리가 '저건 빨간 사과'라고 인식하는 사과에 대해서도 '사과 속에 숨어서 살기 위해 사과를 먹는 애벌레' 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끌어낸다.
그래서 평범한 이야기이지만, 그들이 쓰는 에세이는 책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다. <다정한 편견> 이야기 또한 손홍규 씨가 경향신문에 연재한 칼럼을 정리한 글을 묶어 책으로 만든 작품이었다. <다정한 편견> 책을 읽어나가는 동안 가벼운 총총걸음으로 책 속의 풍경이 들어왔다.
새벽 서너 시 무렵 누군들 졸음이 쏟아지지 않을까. 내가 갈 때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어김없이 잠들어 있었다. 곤히 자는 누군가를 깨우는 일은 무척 곤혹스럽다. 이처럼 곤히 자는 누군가를 깨워야 할 만큼 대단한 일로 찾아온 게 아닌 것 같아 무안하기까지 하다. 잠든 사람은 예외 없이 앳될 만큼 젊다. 멀지 않은 곳에 대학이 있어서인지 낮에도 편의점을 지키는 사람은 대학생처럼 보이는 젊은이들 뿐이다. 반만 뜬 눈으로 바코드를 찍고 내가 구입한 물품을 영수증과 함께 봉지에 넣어준 뒤 내가 문을 열고 나가기도 전에 다시 풀썩 카운터 위로 그 젊은이는 쓰러진다. 번화가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주택가 골목의 편의점이라 뜨내기손님이 적을 테니 잠깐이나마 방해받지 않고 눈을 붙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며 돌아오면 아르바이트라는 낱말이 입속에서 까슬까슬하게 맴돈다. 부업이라는 뜻으로 쓰는 아르바이트는 본래 독일어로 직업, 노동을 뜻한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정문에도 'Arbeit Macht Frei'(노동이 자유케 하리라)라고 쓰여 있었다. 날이 밝아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간다 해도 그 아르바이트생을 기다리는 건 그날 밤 다시 시작되는 야간 근무일 것이다. 내가 그 나이였을 때 등록금 투쟁을 하다 길거리에서 한 대학생이 죽었다. 아르바이트를 수용소에 가둔 채 편히 잠든 자들의 파렴치한 밤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내가 잠들지 못하는 이유다. (p101)
|
|
만약 이 책에 연필로 그린 듯한 삽화가 있었다면, 좀 더 우리는 이야기에 들어가 작가의 시선으로 그때의 풍경과 생각을 읽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림 그리기와 피아노, 글쓰기를 좋아하는 나는 '넌 정말 예술 쪽으로 타고났구나!' 하는 말도 들었지만, 전부 뛰어나게 잘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다. 브런치에서 연재하는 글도 독자가 많지 않을 정도로 그저 그런 글이고, 블로그에 작성해서 발행하는 글도 그냥 막무가내로 쓴 것보다 나은 수준이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마냥 '좋은 책'이라고 말하기보다 한 번은 '했으면 좋을 텐데.'이라는 말을 한다. 책의 저자가 내 글을 읽을 접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이렇게 적는 글이 내가 책을 집필할 때 '그때 난 어떤 책이 좋았더라?'라며 되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정한 편견>을 읽는 동안 편안한 기분이었고, 선풍기의 약풍에 페이지가 넘겨지는 기분이었다. 이 이상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작가 손홍규 씨의 산문집. 단순히 나도 꾸준히 연재하는 글을 누군가 '책으로 내보시지 않겠습니까?'이라며 발굴할 가치가 있어지기를 조용히 바라본다.
경복궁 긴 담을 따라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하는 풍경이야 새삼스러울 게 없으나 나는 거기서 어떤 변화를 발견했다. 예전과 달리 경찰들이 저마다 손에 기다랗고 단단해 보이는 곤봉을 쥔 채 뻣뻣하게 걷는 것이었다. 평화로운 오후였는데도 말이다. 나는 기억을 떠올렷다. 국민의 정부 시절이나 참여정부 시절에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다. 그 시절에는 경찰들이 맨손으로 근무를 섰다. 물론 곤봉을 소지했으나 허리띠에 걸어둔 채였지 그처럼 위압적으로 곤봉을 쥐고 지나가는 시민들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게 의무라도 되듯 피로에 전 사나운 눈빛으로 노려보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그러한 변화가 정권의 속성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라고 여겼다. 군사정권 시절처럼, 군사정권에 탯줄을 두었던 문민정권 시절처럼 말이다. 그 사소한 차이가 정권의 성격을 규정짓는 게 아니라 정권의 차이가 그처럼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일에까지 변화를 불러온 것임을 잘 안다. 이명박 정권은 이미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렸고 모든 걸 뒤바꾸었다. 명백하게도 폭력적으로. (p239)
이 글을 공유하기